어떤 단어를 배워야 할까?

만약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어눌한 발음으로 “무람없지만 요의가 있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 말은 맞지만 너무 낯설게 들릴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 영어 특기자로 입시를 준비했다. 단어를 외우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 남들이 잘 모르는 고급 어휘를 수집하는 데 큰 즐거움을 느꼈다. 화려한 문장을 적으며 혼자 만족감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 교포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영어 수업에서 원어민 교수님을 만나면서 곧 깨달았다. 어려운 단어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제는 상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휘 수준을 가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학자 아우라를 풍기시는 나이 지긋하신 미국 교수님들을 제외하면, 그 외에 상황에서는 상대가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 원어민이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추격스럽다. 징건하다. 이런 단어들은 사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상 활용 빈도수는 낮고,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쓸모없는 고급 어휘
내가 외운 고급 단어들은 실제로는 거의 쓸 일이 없었고, 하나씩 의식의 장식장 속에 진열되어갔다.
- pulchritudinous (아름다운)는 배운지 10년 만에 실제 용례를 책에서 딱 한 번 봤다
- hirsute (털이 많은)
- pusillanimous (비겁한)
- teetotalism (금주주의)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다. 실제 금주를 하던 시절, 명문대를 나온 싱가포르 친구에게 “teetotalism”을 썼을 때 그녀는 알아 듣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안 물어보고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어휘를 사용할 수록 의사소통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원어민이 내 영어를 제2외국어로 인지하는 상황에서, 길고 낯선 단어는 더 큰 방해물로 작용한다. 억양과 발음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갑자기 countenance 같은 단어를 쓰면 원어민은 “내가 잘못 들었나? 물어보면 실례일까?”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컵라면에 캐비어를 올린다고 요리가 고급스러워지지 않듯, 망가진 기초 문법에 격식 어휘 몇 개 얹는다고 언어가 세련되어 지지 않는다.
이는 영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독일어 Duckmäusertum (비겁함) 같은 단어도 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솔직히 말해, 내가 수집한 단어들을 교수님들이 몰라줄 때는 괜히 신경질이 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틀린 표현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책에서 본 동사나 슈피겔 잡지에서 본 표현을 작문에 활용하면 교수님들은 감점을 주셨다. (Das Ausgesetztsein 같은 철학적 표현도 마찬가지였다.)
언어는 결국 합의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자주 쓰이는 어휘로 하고 싶은 말을 유연하게 구사하는 것이 목적이지, 난해한 단어 수집은 유희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어떤 단어를 배워야 할까?
일반 외국어 학습자라면 영어 회화에는 phrasal verbs가 가장 유용하다. 독일어에서는 Nomen-Verb-Verbindungen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상 단어처럼 덩어리로 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외워두면 회화 속도가 빨라진다.
영어
- pick up (배우다, 습득하다)
-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 figure out (이해하다, 해결하다)
독일어
- Entscheidung treffen (결정을 내리다)
- Hilfe leisten (도움을 주다)
- zur Sprache bringen (말 하다)
고급 단어 중에서도 기사, 칼럼, 논문 요약 같은 데서 반복적으로 나와서 실제 활용도가 높은 것들이 있다.
영어
- ubiquitous (어디에나 존재하는)
- resilient (회복력이 강한)
- meticulous (꼼꼼한)
- counterintuitive (직관에 반하는)
독일어
- umstritten (논란의)
- eindeutig (명확한)
- umfassend (포괄적인)
구체적인 지칭 대상이 있는 단어들도 알고 있으면 현지인과의 대화에서 의외로 유용하다. (이런 단어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인풋이 필요하다.)
-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 podiatrist (족부 의사)
- trivet (냄비 받침)
- mnemonic (암기를 도와주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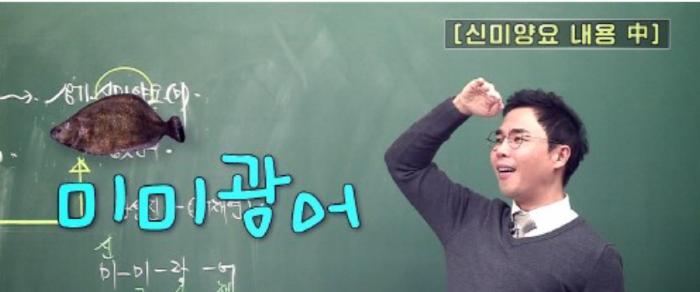
- dog-ear (책 모서리를 접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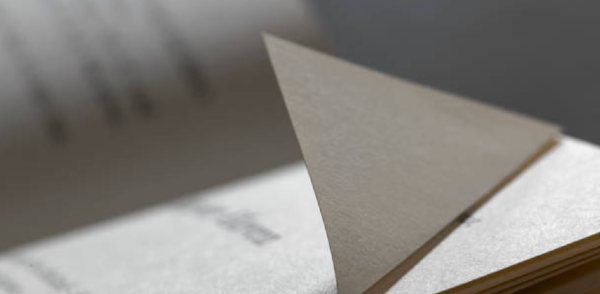
- Mitteilungsbedüfnis (말 하고자 하는 욕구)
- Kummerspeck (우울감을 먹는 것으로 풀어서 찐 살)
반면 unprepossessing(매력적이지 않은), delectable(맛있는)이라는 단어는, 알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unattractive, delicious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준을 넘어 섰을 때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학습 초기에는 active vocab 중심, 나중에 여유 있을 때 passive vocab로 확장하는 것이 이상적인 전략이다.
Register: 단어의 ‘격식’ 문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register다. 같은 뜻이라도, 상황마다 다른 단어가 쓰인다.
- ask (일상) ↔ inquire (격식) ↔ interrogate (강압적)
- 한국어 예시:먹다 ↔ 식사하다 ↔ 진지 드시다
언어를 배울 때 register를 고려하지 않으면, 단어 자체는 맞아도 대화에서는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내가 “컵라면에 캐비어”라고 표현한 것도 결국 register 불일치의 문제다.
언어 학습의 초반에는 중립적이고 자주 쓰이는 register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에 상황에 맞춰 격식을 높이거나 낮추는 register 전환 능력을 기르면, 비로소 어휘력이 힘을 발휘한다.
결론
지금의 나는 어려운 단어보다 실제 쓸 법한 단어와 표현을 찾는 데 더 관심이 많다.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격식 어휘를 과감히 무시한다.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실제 활용도가 높은 표현을 배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언어는 결국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아는가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단어를 어떻게 고르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사전 속 장식품 같은 단어보다, 실제 사용되는 살아 있는 말에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