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의 표현

며칠 전 회사에서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왔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통증의 강도가 점점 미주신경을 자극할 정도로 커졌다. 어지러움이 동반되고 순간적으로 실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회사 내에서 실신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즉시 대처가 필요했다.
우선 신속하게 가능한 원인들을 하나씩 제하고 나니, 급성 장염이 잠깐 의심되었지만 전형적인 장염 증상은 아니었다. 통증을 없애기 위해 결국 점심시간에 사무실 건물 안에 있는 오래된 내과를 찾았다. 작년 4월 이미 한번 실신 후 수액을 맞은 적이 있는 곳. 선생님이 상당히 고령이시다. 이번에는 진료실 벽 한쪽에 전 대통령 주치의 출신임을 보여주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의사라고 하여 초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의미한 포인트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연결시켜 진단 및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오랜 학문적, 임상적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다. 환자로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증상을 기술하는 일이다. 특히 ‘배가 아프다’는 표현은 진단적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통증의 위치·양상·주기·완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선생님은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듯 했지만, 그의 임상 경험은 믿었다. 검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 그의 경험에 대한 신뢰 하에 진경제만 받았다. 다행히 통증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통증이 장의 연동운동(peristaltic contraction)과 유사한 주기로 반복되었고, 열 자극(핫팩)에 의해 일시적으로 완화된 점으로 미루어 감염보다는 근육성 경련의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원인 불명의 비감염성 장 근육 뒤틀림’ 정도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급성 통증이 있을 때, 특히 미주신경성 실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기절하기도 한다. 게다가 나는 원래 혈압도 낮아서 실신 위험군이다. 오늘은 다행히 피할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경험담을 찾아봤다.
세상은 넓고, 온갖 험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70억 인구 모집단 내에서는 일반적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은 겸손함을 주기도 하고, 약간의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관련 글을 읽다 보니 문득 생각이 스쳤다. 통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통증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의 정확성은 상호 이해에 의존한다. 내가 보는 빨간색이 상대방이 보는 빨간색과 같을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만, 어쨌든 가능한 생생하게 수식어를 잘 사용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통증의 언어적 표현
Mild < Moderate < Severe < Intense < Excruciating
‘살살 아프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mild pain에 가장 근접하지만, “배가 살살 아프다”와 “I have mild pain in my abdomen”은 어감상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어의 ‘살살’에는 통증의 강도뿐 아니라 감각의 질이나 주기가 내포되어 있으나, 영어에서는 이러한 뉘앙스를 별도의 수식어로 분리해 기술해야 한다. 따라서 “I have mild pain in the upper left abdomen that comes and goes, with a slight throbbing sensation.”처럼 통증의 강도, 위치, 주기, 감각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병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만약 통증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면, “It’s annoying but manageable.”, 일상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면 “It interrupts my daily tasks”과 같이 주관적 체감 수준을 덧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복부 통증은 일반적으로 부위에 따라 상복부(upper abdomen, epigastric region), 중복부(middle abdomen, umbilical region), 하복부(lower abdomen, hypogastric region)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위치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좌우 구분을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 “upper right abdomen” 또는 “mid-left abdomen”처럼 결합 표현이 가능하며, 진료 시 통증을 국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증의 주기 역시 중요한 기술 요소다. 통증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constant 또는 persistent,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면 intermittent, 예기치 않게 날카롭게 발생한다면 sudden 또는 sharp으로 표현한다. 만성적이면 chronic이다. 이러한 기술은 통증의 병태생리적 원인을 추정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된다.
위장 부위의 통증 중 속쓰림은 burning sensation으로 묘사하며, 위산 역류로 통증이 흉부까지 확장되는 경우에는 heartburn이라 부른다. 이때 필요한 제산제(예: 개비스콘)는 영어로 antacid라고 한다.
상대적 비교나 경험 기반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도 직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n a pain scale of 1 to 10, with 10 being burned alive, it’s about a 6 or 7.”, “If giving birth was 9, this is an 8”과 같이 과거의 경험이나 비유적 비교를 통해 통증 강도를 수치화하면 의사소통의 명료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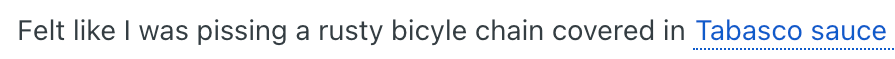
통증의 비언어적 표현
학창시절 체해서 조퇴를 하러 교무실에 간 적이 있었다. 민간 요법으로 사이다를 마시느라 한 손에 들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사이다와 나의 침착한 표정을 번갈아 보시며 “아픈데 웬 사이다야?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라며 반려하셨다. 아마도 내가 입술에 컨실러를 바르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면 조퇴는 바로 승인되었을 것이다. 반면 급성 고양이 알레르기로 얼굴이 퉁퉁 부은 날이 있었다. 얼굴 전체가 부풀어 올라 시야가 좁아질 정도의 붓기였지만, 통증이나 불편감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얼굴을 보자마자 즉시 귀가를 지시했다.
이처럼 인간은 통증이나 이상 상태를 판단할 때 시각적 단서에 강하게 의존한다. 이러한 경향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사회적 포유류는 집단 내 생존과 상호 보호를 위해 타인의 신체적 이상을 신속히 감지해야 했다. 얼굴의 창백함, 움직임의 둔화, 신음, 떨림 등은 생리적 위기의 신호로 기능했다. 이를 인지한 주변 개체는 감염 회피나 돌봄 행동으로 반응했으며, 이러한 시각·청각 기반의 위험 탐지 체계는 이후 공감 반응과 사회적 결속 행동의 신경적 토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된 반응은 현대 사회에서는 오판을 유발하기도 한다. 외관상 멀쩡하면 통증이 과소평가되고, 반대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면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된다. 즉, 인간의 뇌는 여전히 시각적 단서 중심의 평가 전략을 따르지만, 이는 합리적 판단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면 상황에서 통증을 전달할 때는 언어적 기술뿐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입술이 파래지거나 얼굴의 혈색이 사라지는 등 비의지적 생리 신호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징후가 없는 통증의 경우(예: 신경통, 내장통 등)에는 의도적으로 표정, 제스처, 자세 에 의존해 설명력을 높여야 한다. 상대가 단순할 수록 비언어적 표현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통증을 언어로 기술한다는 것은 감각을 객관화하는 과정으로,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결국 ‘정확히 느끼고 정확히 말하는 것’에 있다.